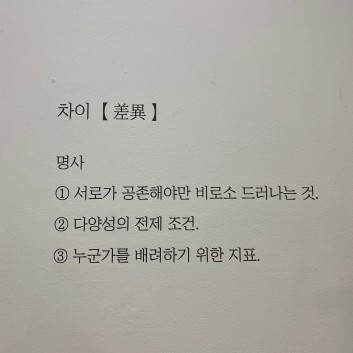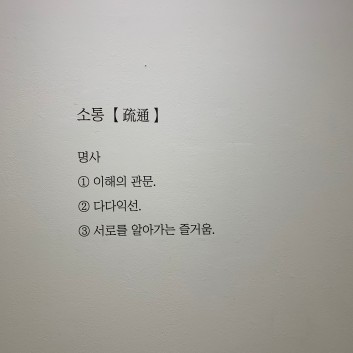작품 사진
<재정의하기>
<경계>
지키기에 급급해 너무 많은 선을 그어온 건 아닐까 생각한다. 분리하고 끊어낼 수 없는 연속적 흐름을 우리는 억지로 떼어내고 구분 지어 몰아내진 않았을까. 실은 파편들이 만들어내는 그림도, 파편의 본질도 하나인데. 과정을 미워하면 안 돼, 그게 곧 나이기도 하니까. 완전히 같지 않아도 같이 갈 수 있다. 우선 그 빛깔의 다름을 안다면. 무리가 아니라면, 그 주머니에 담을 수 있는 만큼만 들여줘. 멈추지 않고 너울거리는 바닷물이 그리는, 유동적인 경계선의 이미지를 빌어 언어의 의미를 담아본다. 젊음이라는 명사를 푸름 (靑)에, '나이 들다'라는 동사를 '땅으로 돌아간다'라는 문장에 담아본다. 조금씩 다른 성질을 지닌 흙에, 조금씩 다른 빛깔을 띠는 유약을 입힌다
<색안경>
다른 세대의 얼굴이 겹쳐있다. 바라보는 이에 따라 청년이 되기도 하고, 노인이 되기도 하는 덩어리는 사실 두 가지 얼굴을 모두 가지고 있다
<Our Grandpa>
현대 사회에서 기성 세대와 청년 세대, 양극 간의 갈등이 극심해지고 있다. 서로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어쩌면 그 이면은 같지 않을까. 〈우리 할아버지〉는 젊은이들이 가득한 코엑스에서 친구들과 보내는 할아버지의 일상으로 시작되며 전쟁과 민주화 등 청년들이 경험하지 못한 그의 인생사가 이어진다. 이 작품은 세대 간의 간극을 줄이고 우리들의 할머니와 할아버지, 기성세대를 한 번쯤 주의 깊게 바라보자는 취지에서 2016년 제작되었다. 과거와 현재에서 살아가는 그들과 현재와 미래를 바라보는 청년들. 우리가 함께 현재를 살아가는 방법을 대화와 공감, 소통으로 함께 고민해보자
<차이 없는 구별 (사유의 바다)>
함께 살아가며 주변 사람들을 통해 스스로를 알게 되고, 나를 완성시켜 간다
나의 기쁨과 슬픔의 감정은 타인과의 관계에서 만들어졌고, 나의 호, 불호 또한 타인과의 관계에서 만들어졌다
말하고 듣는 과정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있기에, 말하는 사람이 존재하기에
그 속에서 “나”라는 존재는 점점 더 확실해지고 탄탄하게 조립되어 가고 있다
존재하는 수많은 관계에 얽힌 나는 그리고 당신들은 혼자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다
관계라는 것은 생각을 하게 만들고 그 생각은 “나는 누구 인가?”에 대한 답을 내려주는 듯하다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는 우리들은 71%의 물과 18%의 탄소, 4%의 질소, 2%의 칼슘, 1%의 칼륨 및 한 숟갈 분량의 희유원소로 구성되어 있다. 어느 한 사람이 특별하게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특별함을 가지게 되고, 때로는 평범함을 가지게 되는 것이었다. 이러한 모습은 바다, 파도를 연상케 했다. 파도는 휩쓸린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의 분자, 여러 속성들은 자신의 방향으로 힘차게 용솟음친다
특별하지 않은 바다, 물의 속성은 우리와 같다. 파도가 바위에 부딪히며 수많은 물방울들이 하늘의 공기를 가르지만 다시 파도 속으로 들어간다
아무 일도 없었던 듯이. 잠깐의 특별함은 이목을 집중시키지만 다시 환호의 무더기 속으로 들어간다
<크로스 드레싱>
청년과 노인이 서로 옷을 바꾸어 입어오고 인터뷰 한 내용을 담았다. 크로스드레싱 작업은 정체성과 외형의 고정적 관계에 대해 의문을 던지는 행위이다. 사진와 함께 배치된 그 사람의 말을 함께 읽음으로, '어떠한 모습'의 개인이 아닌 '어떠한 생각'을 지닌 개인으로 바라보는 기회를 제공한다
<비-과학적-묵묵실험>
‘개인은 소비로 자신을 드러낸다’는 밀레니얼 세대를 묘사할 때 곧잘 쓰이는 표현이다. 좋아하는 가수의 얼굴이 새겨진 인형, 추구하는 신념이 적혀있는 티셔츠.
그런데 이거, ‘밀레니얼 세대’만의 특성일까?
모든 개인은 소비를 하고, 모든 소비는 개인을 반영한다.
별도 책자로 준비된 <비-과학적-묵묵실험>에 작품을 감상하는 순서와 해설이 제공된다
<은진미륵>, <자금성>, <미술관 견학>, <예식장>, <천지연 폭포>
작품을 보면 주로 기념 사진이 등장한다. 개인이 아닌 군집 형태의 기념 사진들이 많은데 과거의 사진은 물론이요, 오늘날 각종 단체들이 답사 혹은 여행 기념으로 촬영한 사진도 있다. 예를 들면 경주의 불국사, 첨성대, 예산 수덕사, 부여 정림사지 5층 석탑, 명동 성당과도 같은 한국의 주요 건축물을 배경으로 찍은 기념 사진들을 볼 수 있다. 더불어, 수십 명에 이르는 많은 사람들이 서로 층을 만들고, 키가 작은 이는 앞쪽에, 키가 중간인 이들은 중간층, 그리고 키가 큰 이들은 맨 뒤쪽에 발 뒤꿈치를 올리고 서서 단체 사진의 정경을 만들고 있다. 어린 시절 여행지에서의 추억은 우리에게 늘 행복한 여유와 웃음을 선사한다. 그리고 그 것을 기록한 기념 사진, 가장 한국적이고 가장 가족적인 형태의 장면들이 그 정경 안에 등장하는 것이다. 누구나 몇 권씩은 가지고 있을 사진 앨범들, 집의 장롱 속이나 책장 구석에서 곱게 잠자고 있을 그 낡은 앨범 속에는 교복을 맞춰 입고 친구들과 소담한 마음으로 여행의 흔적을 기록하고자 촬영한 사진들이 숨어 있다. 지금은 예순이 다 되신 나의 부모님 사진과 함께, 이제 서른을 갓 넘긴 내 사진들이 더불어 공존하고 있으며, 70년대의 빛바랜 흑백 풍경과 90년대의 천연색 풍경 사이에서 이질적인 모습은 전혀 발견할 수 없다. 기념사진의 장면을 통해 나이와 세대를 아우르는 일종의 '끈'이 만들어진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정육면체>
세상은 둥글다는데, 내가 서 있는 세계는 평면이다. 나는 나만의 선, 나만의 면, 나만의 배경 속에서 살아왔다. 정육면체에 존재하는 고유의 2차원적 평면들처럼. 하지만 영원히 만날 수 없을 것 같은 나의 세계와 타인의 세계는, 한 수준 높은 차원에서 서로 겹치고 맞닿는다
[정육면체 1] 백색의 큐브에 프로젝션 된 움직임은 누군가 걷고, 악수하고, 팔을 뻗고, 응시하며 다른 평면과 상호작용하는 모양을 드러낸다
[정육면체 2] 각기 다른 면에서 걸어가는 다양한 세대의 우리들은 정육면체의 중심에서 만나게 된다
<가입하세요>
‘한국인은 이름을 묻기 전에 나이부터 묻는 습성이 있어’라는 우스갯 소리가 있다. 영 틀린 말은 아니라 씁쓸하다. 낯선 이를 알아갈 때 먼저 확인하는 것들이, ‘너 (개인)는 어떤 사람이야?’ 보다 ‘어떤 집단에 속한 사람인가’로 치우친 때가 많다. 집단의 일원으로서 개인을 인식하는 일은 위험하다. 개인의 특성을 과대 해석해 집단의 특성이라 오인할 수 있고, 집단의 특성을 개인의 특성이라 성급히 못 박을 수도 있다.
<가입하세요>는 회원 가입서에 작성을 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개인을 알아가는’ 설문을 제시하고, 그 것에 가입함으로써 가게 될 뉴-월드로의 길을 안내한다. 관객은 체험과 경험으로서의 작품을 느낄 수 있다.